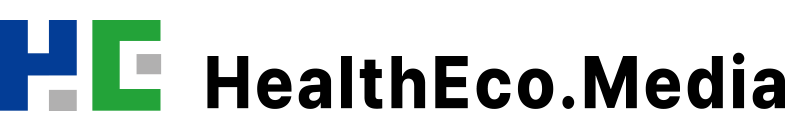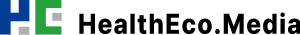교육부가 지역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동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지역 고교생이 대학 진학 전부터 전문교육을 체험하고, 입학 후에도 정주와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책을 촘촘히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2025년 시범사업에 선정된 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5년간 총 12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맞춤형 인재육성 모델을 시험 운영하게 된다.
왜 지역인재인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의 이중 위기
지방대학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입학 정원 미달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고착되면서,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고 지역 경제와 서비스 인프라가 약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지역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정주 여건과 연계한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출발점이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했다. 지자체가 대학 지원 권한과 예산을 위임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은 바로 이 라이즈 체계를 실현하는 첫 단계로, 고교-대학-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 정책으로 설계됐다.
교육 전(前)·중(中)·후(後) 전 단계 포괄… 고교부터 정주까지
①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은 고교 재학 중 지역 대학의 심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수한 과목은 고교 학점은 물론, 해당 대학 진학 시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단순한 진로 탐색 수준이 아니라, 학문적 연계성과 실질적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지역대학 진학의 실질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② 지역인재전형의 확대 및 고도화
기존의 단편적인 지역인재전형에서 나아가,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 분야에 부합하는 정밀한 전형 모델이 개발된다. 예컨대 농생명·의료·소재부품 분야 등 지역산업과 연계된 전형을 통해, 졸업 후 지역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선발하게 된다.
③ 입학 전 Pre-College 프로그램
대학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개강 전 맞춤형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학력 보완을 넘어, 전공 적응력 향상 및 학사 이탈률 감소에 목적이 있다. 특히 의학, 공학 등 진입 장벽이 높은 학문 분야의 경우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타 부처 사업과의 유기적 통합… 보건·산업·정주 지원까지
이번 사업의 강점은 교육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사제’, 산업통상자원부의 ‘RAPID 프로젝트(지역앵커기업-대학 기술개발)’와 같은 타 부처 사업과도 전략적으로 연계된다.
의료분야: 고교단계에서 생물 심화수업 → 지역의대 지역인재전형 → 입학 전 예비교육 → 지역 병원 수련 → 정주지원(주거·수당 등)
공학분야: 고교 물리 심화과정 → 공학계열 특화 전형 → 지역 앵커기업과 기술개발 협업 → 지역 취업 및 정착
이처럼 ‘교육→정착→고용→삶’으로 이어지는 폐쇄루프(closed loop)를 통해 실질적 지역 정주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시범지역 외 확대 위한 구조적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시범 사업의 성과가 전국 확산의 관건이라고 본다. 단순히 사업 예산만이 아니라, 지역 산업 및 대학 역량, 교육청 협조 등 ‘3자 협력 체계’가 얼마나 원활히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방지를 위한 공정한 사업 선발 기준과 성과 평가체계도 필요하다.
“라이즈는 플랫폼, 지역은 주체”… 맞춤형 모델 개발이 관건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별 창의적 모델이 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획일화된 중앙 설계가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되는 분권적 정책이란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지역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자체와 대학,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HealthEco.Media 김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