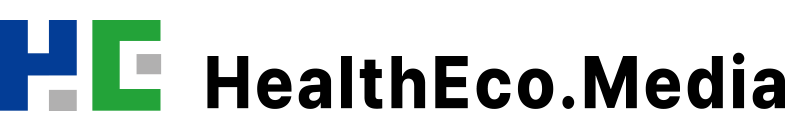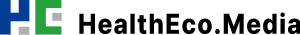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1970년 타임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올리는 것이다"라는 프리드먼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 원칙은 오랜 기간 기업의 역할을 정의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개념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글로벌 경영 업계는 이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이윤이 아닌 다른 것을 실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바로 ESG이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영단어의 약자이다.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최근 전 세계 경영 분야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개념이다. ESG라는 용어는 2004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 보고서에서 공식 용어로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은 ESG를 고려한 글로벌 투자 운동을 주도하며, 기업의 지속가능 운동의 씨앗을 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다. 기업 차원에서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 측면에서는 SRI(사회책임투자)라는 개념으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18세기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는 1760년 설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현대적 의미에서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처음 활용한 투자회사는 팍스 월드이다. 이 회사는 1971년 베트남 전쟁 관련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최초의 윤리적 투자펀드인 팍스 월드 펀드를 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는 주로 윤리적 선언에 머물렀다.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그 자체에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ESG 개념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과를 위한 필수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ESG를 기업의 주요 평가자산 및 비즈니스 전략으로 삼는 움직임이 보편화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ESG 부문 상위 20%에 해당하는 주식은 변동성 장세에서도 다른 기업에 비해 5% 포인트 이상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트렌드는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글로벌 컨설팅업체 딜로이트는 전망하였다.
즉, 프리드먼 독트린의 종말을 고하고, 지난해 세계 경제 포럼이 새롭게 선언한 것처럼 기업은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ESG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SK텔레콤은 ESG를 단순히 윤리적 차원이 아닌 기업 운영 전반의 패러다임으로 설정하였다. SK텔레콤은 ESG 관련 전담 부서 및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국내 통신사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았으며, 친환경 분야에서 중증장애인 출퇴근 지원사업인 착한 셔틀을 운영하고, 코로나 방역 및 백신 접종 분야에서 인공지능 '누구 케어콜'을 활용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0원 셀러' 프로그램 등을 통해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은 ESG 경영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 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0 상장기업 ESG 평가 및 등급에서 통합 등급 A+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SK텔레콤이 자타공인 ESG 경영의 선구자로 인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ESG는 2004년 처음 거론된 개념이다. 그로부터 17년이 흐른 지금, ESG가 글로벌 경영 화두로 급격하게 떠오르게 된 것은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HealthEco.Media 정진성 기자 |